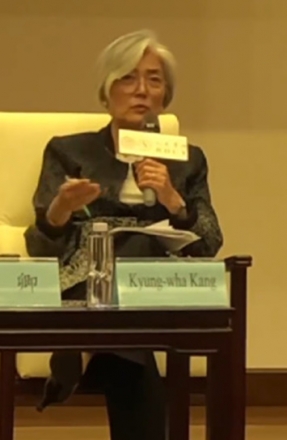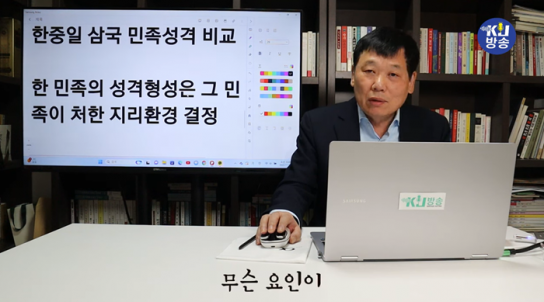- 김호림의 연변 지명 이야기
●김호림
마을 한복판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다. 반듯한 돌로 둘레를 쌓아올렸고 용두레를 잣아 드레 박으로 물을 퍼서 올렸다.
“물이 많고 맑았는데 맛 또한 좋았지요.”
최흥수씨는 우물처럼 깊은 기억을 퍼서 다시 눈앞에 떠올렸다. 그는 이 우물 근처의 동네에서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이다.
예전에 우물은 동네방네 소문을 놓았다고 한다. 용두레우물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우물이 있는 마을도 용두레마을이라고 불렸다.
용두레마을은 청나라 선통(1908—1912)년간 조선인들이 와서 세웠다고 한다. 훗날 중국말로 지명을 적으면서 용두레의 용(龙)자와 우물 정(井)자를 묶어서 “용정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옛 우물가에 있었던 백년가옥.
잠간, 이야기가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용두레마을 즉 용정이라고 하면 뉘라 없이 자연스럽게 해란강기슭의 옛 마을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실 이 용두레마을은 해란강이 아닌 훈춘하의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연변에서 이런 동명의 지명은 결코 한두 개가 아니다. 남쪽의 양지바른 곳 혹은 작은 여울이라는 의미의 남양(南阳)은 무려 일여덟 번이나 등장한다. 다만 용정은 하도 유명한 지명이라서 류달리 이상하게 여겨질 따름이다.
이 용두레 우물 역시 몇 십 년 전에 땅밑에 묻혔다. 이에 비하면 우물가에 있던 옛 기와집은 운이 좋은 셈이다. 허물리지 않고 길 서쪽에 통째로 옮겨졌던 것이다. 용두레 우물의 옛 주인이 살고 있었을지 모를 백 년 가옥이었다.
“마을에서 잘나가던 부자라고 해요. 토지개혁 때 청산되었다고 하지요.”
미구에 용두레마을 역시 선후하여 동광촌(东光村) 1대(촌민 소조), 전선촌(电线村) 4대로 이름이 바뀌면서 집단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옛 우물은 그렇게 옛 가옥의 부자처럼 말끔하게 “청산” 된 셈이다.
한때 용두레 우물이 두레박처럼 이름을 걸고 있던 동광촌은 춘경촌(春景村)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춘경은 민국(1912—1949) 초년 조선인 몇 가구가 이주하면서 생긴 마을인데 말 그대로 “봄날의 경치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1940년 무렵 일본 다카스 개척단(高鹫开拓团)이 진입하면서 이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는 산산조각이 되여 버린다. 개척단은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듯 원래의 이름을 삼켜버렸던 것이다.
일본개척단은 일명 “만몽개척단满蒙开拓团)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다. 대규모의 이민은 1936년 백만 가구 이민계획이 실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약 10년간 무려 860여개의 개척단이 만주땅에 들어섰다.
이때 일본은 수매(收买)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땅을 빼앗았으며 또 “위험한 땅”, “군용지”, “치안유지” 등 잡다한 구실로 좋은 땅을 몰수하여 개척민들에게 나눠줬다. 원주민들은 부득불 외지로 이주하거나 황량한 지역에 가서 또 다른 “개척민”이 되였다. “만주개척년감(满洲开拓年鉴)”의 기록에 따르면 1943년까지 이런 개척민은 무려 4만 0771가구의 20여만 명이나 되였다고 한다.
훈춘에 출현했던 개척단은 8개, 의용단은 1개로서 도합 3004명이었다. 의용단은 말이 개척단의 일부이지 실은 일본군 예비대로 주요하게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개척단과 의용단은 모두 1부락, 2부락, 3부락 혹은 상, 중, 하 부락 등 이름으로 원래의 마을 이름을 바꿨다.
와중에 다카쓰 개척단은 여섯 부락을 설립하며 이때 동광 지역에도 그들의 집단부락을 앉혔다.
일본이 전패하면서 그들의 개척단도 파산한다. 다카쓰 개척단은 1945년 8월 훈춘진에 집결하며 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6년 후인 1951년 일본 정부의 통지를 받고 귀국하였다고 한다.
그 무렵 훈춘 경내의 일부 조선인들이 옛집단 부락에 와서 국영농장을 세웠다. 1956년 고급 농업생산 합작사를 세울 때 “동광”이라는 새 이름을 짓고 일본인 부락의 흔적을 밀어냈던 것이다. 동광촌은 지난 세기 80년대에 이르러 22가구의 작은 동네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개척단 일본인의 잔영은 오랜 후에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닭 덕대 산’까지 전깃줄을 늘였다고 합니다. 그 전깃줄이 우리 마을을 지났다고 하지요.”
최흥수씨가 자못 정색해서 말하는 전선촌의 내력이었다.
옛날 전깃줄은 시골에서 사막의 물고기만큼이나 생소한 물건이었다. 이에 따라 전깃줄이 드리웠던 마을은 아예 “전선촌”으로 불리게 되였으며 나중에 그 이름이 다른 지명을 물리치고 현지에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필자/김호림(중국)
BEST 뉴스
-

“터무니없는 괴담, 정치 선동의 불쏘시개 될라”
글 | 허훈 최근 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중국인 괴담’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내년까지 중국인 2천만 명이 무비자로 들어온다”, “아이들이 납치돼 장기 적출을 당한다”는 식의 주장들이 버젓이 퍼지고 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에도 수백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수십 차례 공유하... -

“이게 한국의 환영 방식인가”…이태원 식당의 ‘금뇨(禁尿)’ 표지판이 던진 질문
[동포투데이] 서울 이태원 한 식당 앞.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로 적힌 안내문이 서 있다. “길을 막지 마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금연.” 얼핏 보면 평범한 문구지만, 중국어 문장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더 있다. ‘禁尿(소변금지)’. 그 한 단어는 마치 중국인만 따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듯... -

백두산 현장르포① | 민족의 성산, 천지를 마주하다
[동포투데이] 2025년 9월 26일 아침, 백두산 자락은 맑은 하늘 아래 싸늘한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다. 정상에 오르는 길목에는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카메라를 든 한국인 청년들, 러시아와 몽골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백두산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긴 오르막을 지... -
![[기획연재②]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교육·신앙·항일의 불씨](/data/news/202509/news_1759108360.1.jpg)
[기획연재②]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교육·신앙·항일의 불씨
[동포투데이] 백두산 자락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서면 용정시 명동촌이 나온다. 소박한 기와집과 푸른 담장이 맞아주는 이 마을은 시인 윤동주(1917~1945)의 고향이다. 그러나 이곳은 한 시인의 생가를 넘어선다. 근대 조선 민족운동의 요람이자, 교육·종교·문화가 교차한 북간도의 심장부였다. 1906년 서전서... -
![[기획연재①]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문학, 민족, 그리고 기억의 장소](/data/news/202509/news_1759037552.1.jpg)
[기획연재①]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문학, 민족, 그리고 기억의 장소
[동포투데이] 2025년 9월 25일, 기자는 길림성 용정시 명동촌을 찾았다. 이곳은 애국시인 윤동주(1917~1945)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다. 복원된 생가는 소박하게 서 있고, 그 앞마당에는 여전히 들판에서 불어온 가을 바람이 머문다. 마을 입구의 표지석은 단순히 한 시인의 흔적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명동촌... -

백두산 현장르포② | 폭포 앞에서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동포투데이] 백두산 천지를 마주한 뒤, 발걸음을 옮겨 백두폭포(중국명 장백산폭포)로 향했다. 천지에서 흘러내린 물길은 가파른 절벽을 타고 떨어지며 웅장한 포효를 만들어냈다. 높이 68미터, 너비 30미터에 달하는 폭포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치 대자연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굉음을 쏟아냈다. ...
실시간뉴스
-
백두산 현장르포③ | 지하삼림, 천지의 그늘 아래 살아 숨 쉬는 또 하나의 세계

-
백두산 현장르포② | 폭포 앞에서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
[기획연재②]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교육·신앙·항일의 불씨
![[기획연재②]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교육·신앙·항일의 불씨](/data/news/202509/news_1759108360.1.jpg)
-
[기획연재①]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문학, 민족, 그리고 기억의 장소
![[기획연재①]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문학, 민족, 그리고 기억의 장소](/data/news/202509/news_1759037552.1.jpg)
-
백두산 현장르포① | 민족의 성산, 천지를 마주하다

-
“해방군인가, 약탈군인가”…1945년 소련군의 만주 진출과 동북 산업 약탈의 기록

-
“고층에 살면 수명이 짧아진다?”…연구가 밝힌 생활 속 건강 변수

-
여성 우주인, 왜 우주비행 전 피임약을 먹을까

-
반려견 키우기의 ‘10가지 부담’…“귀여움 뒤에 숨은 책임”

-
“총구 겨눈 혈맹, 1969년 중·북 국경 위기의 전말”















![[르포] “김치 향 가득한 아리랑 광장”…연길서 펼쳐진 2025 연변 조선족 김치문화축제](/data/news/202508/news_175549163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