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황건일 前 이사장이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유공 국민포장 수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16일 수여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임재훈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가 포장과 포장증을 전달했다.
이번 정부포상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 세계 모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접수하고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총 88명이 포상 수여자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황건일 전 이사장은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 교사동 증축,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모금, 토요한글학교 운영을 통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등 6년 동안의 이사장으로서 공적과 호치민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해외 민간대사직 수행 등 각종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공적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임재훈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국민포장을 받는 황건일 前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를 재외한국학교 중 최고의 명문학교로 발전하도록 헌신한 것과 호치민시 동포 사회 발전에 헌신한 업적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고마움을 국민포장으로 표현한 것이”라며“학생, 학부모 및 모든 교민을 대신하여 그동안의 봉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BEST 뉴스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류지 변경 신고(전입·전출)를 토대로 산출됐으며, 국민 대상 ‘국내인구이동통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법무부는 27일 시민단체와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 법무부) [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는 27일 시민단체와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출입국 인원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이민관리국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이민관리 업무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의 출입국 관리기관이 확인한 출입국 인원은 총 6억9700만 명(연인원)으로, 전년 ...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외교부가 춘절(설) 연휴를 앞두고 일본 체류 및 입국을 계획 중인 자국민들에게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일본 내 치안 불안과 잇단 지진으로 체류 안전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공영방송 CCTV 를 통해 발표한 공지에서 “최근 일본 내에서 중...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가 동포 체류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체류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국내 체류 동포 86만 명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취지다. 이... -

재외동포가 지은 공관, 60년 이어진 고베 총영사관
[인터내셔널포커스] 재외동포들의 모금으로 설립된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설립 배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일본 고베 지역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며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기증을 주도한 故 황공환(1921~1986) 전 고베상은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
NEWS TOP 5
실시간뉴스
-
재외동포가 지은 공관, 60년 이어진 고베 총영사관

-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창립 2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제13기 임원진 발대식 개최

-
한국 방문 넘어 ‘인생 전환점’… 고려인 청년들 모국 연수 마무리

-
2026 재외동포청년 학업지원 접수 개시

-
베트남에서 ‘독도 사랑’ 꽃피우다

-
이 대통령, 튀르키예 동포 간담회… “동포 사회의 헌신이 한국과 튀르키예를 잇는 힘”

-
아오자이·한복으로 물든 등굣길… “함께라서 행복한 하루”

-
남미 12개국 한글학교 서울 집결… “차세대 정체성·K컬처 확산 논의”

-
사할린동포 2세 24명, 모국 체험 위해 일주일간 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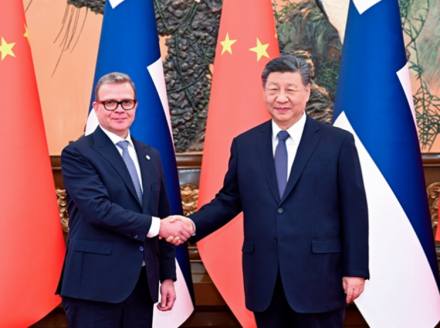

![[기획 연재 ④] 총과 권력이 만든 성의 무법지대](/data/news/202601/news_1769224829.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