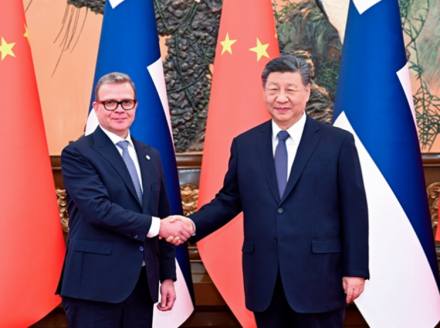- - 서류심사 및 선발캠프 거쳐 초등 40명․중등 30명․고등 31명 최종 선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잠재력을 지닌 101명의 초·중·고 청소년 발명 인재를 2014년도 ‘제12회 발명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발명장학생 선발에는 630명의 학생이 신청했으며, 단계별 선발 과정을 거쳐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1명 등 총 101명의 학생이 제12회 발명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됐다.
더불어, 발명교육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발명교육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통해 적정수준의 역량을 갖춘 정원 외 1명이 고등학교급에서 추가 선발되었다.
이번 발명 장학생 선발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의 신청 접수를 받고 그동안의 발명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1단계 서류심사와 2박 3일간의 선발캠프 기간 동안 관찰평가 및 면접평가의 단계를 거쳤으며, 발명장학생 선발 기준은 지속적인 발명활동 참여의지, 지식재산권 창출 및 문제해결능력 등이다.
제12회 발명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발명장학생 증서 및 메달 수여와 함께 발명활동장려금이 수여되며, 사회경제적배려계층 선발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추가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는 개별특성진단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문가에 의한 창의성, 직업 성향 등에 관한 상담·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해 선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 진로설계를 하도록 도와, 장차 지식재산기반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발명장학생 선발 제도는 발명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창의발명활동을 장려하고 바람직한 발명인재상을 정립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752명의 발명장학생이 선발되었고, 이들 중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우수 사례자들을 발명장학생 홈페이지(www.koinss.net)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인재개발연구본부 어용호 본부장은 “그동안 발명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는 리더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올해도 어려운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된 발명장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시간뉴스
-
‘전통의 손길, 오늘의 만남’, 도쿄에서 만나는 한국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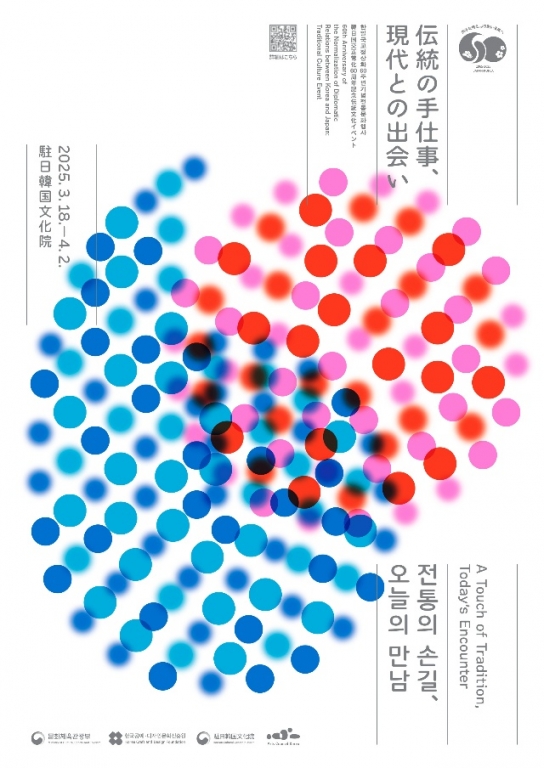
-
재즈댄스 페스타 vol.2 'Moment' 정기공연

-
대한워킹투어협회,'청계천 역사문화길 걷기대회' 성료

-
송곡대학교SGAE글로컬대학 성인학습자전형 실용무용예술학과,무용교육학과,공연예술기획학과 신설

-
(사)글로벌청소년센터, 우리마을 동행축제 개최

-
2024 카시아 문교협국제무용콩쿠르 성료

-
‘인생을 멋지게’ 이인권 대표 북토크,,,“출세보단 성공을”

-
‘태권발레 in 힐링스쿨’ 2024 신나는 예술여행 ‘전국 공연’

-
제17회 '대한민국환경문화페스티벌·한중 환경사랑교류제' 개최

-
2024 미스월드 차이나, 한국 지역 대표 선발전 내달 24日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