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허훈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가 오는 12월말까지 마감이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이 이제 한달정도만 남았다, 이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미루어 가다간 막바지에 자진신고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제때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구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발되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이 이제 한달정도만 남았다, 이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미루어 가다간 막바지에 자진신고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제때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 더 이상 구제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발되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정부가 2026년을 전후해 영주권(그린카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 확대, 장기 해외 체류자 재입국 심사 강화, 혼인 이민 검증 강화 등 영주권 관리 전반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미 경제지 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The Financi...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류지 변경 신고(전입·전출)를 토대로 산출됐으며, 국민 대상 ‘국내인구이동통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법무부는 27일 시민단체와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 법무부) [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는 27일 시민단체와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외교부가 춘절(설) 연휴를 앞두고 일본 체류 및 입국을 계획 중인 자국민들에게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일본 내 치안 불안과 잇단 지진으로 체류 안전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공영방송 CCTV 를 통해 발표한 공지에서 “최근 일본 내에서 중...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출입국 인원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이민관리국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이민관리 업무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의 출입국 관리기관이 확인한 출입국 인원은 총 6억9700만 명(연인원)으로, 전년 ...
실시간뉴스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강제퇴거 두려움 벗는다

-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본 국적 화교의 고민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10월 24일부터 시행…APEC 정상회의 대비 보안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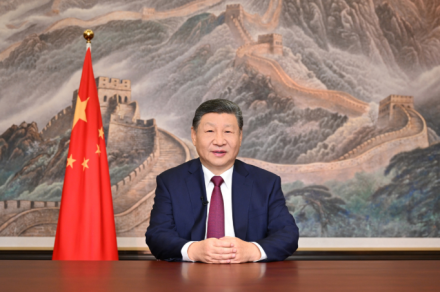
![[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data/news/202512/news_1766370493.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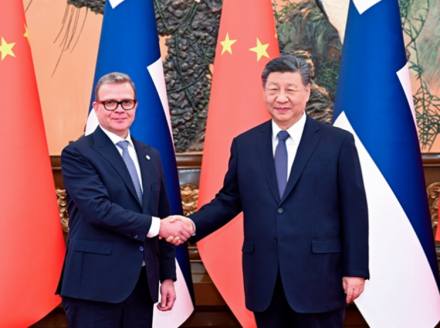

![[기획 연재 ④] 총과 권력이 만든 성의 무법지대](/data/news/202601/news_1769224829.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