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하계 다보스포럼)가 오는 9일~11일까지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리게 된다. 4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하계 다보스포럼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해 특별축사를 한다고 밝혔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지난 2007년 처음 열린 이래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올해 포럼은 ‘성장의 새 청사진을 그리자’라는 주제로 과학 혁신·산업 전복·경제 불확실성·중국 뉴노멀·환경보호, 휴머니즘 등 6개 분야별 150여 차례의 분과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90개국의 1700여 명 귀빈들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 혁신 배경에서 중국 및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과 중대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논의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재 참석 확인된 국가 지도자 및 정부 수반으로는 러시아의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몽골 치메드 사이한빌렉 총리, 이라크 하이데르 알아바디 총리 등이다. 한편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도 이번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트럼프 행정부, 그린란드 확보 방안 논의…군사적 선택지도 거론
[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군사적 선택지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영 방송 CCTV는 7일 보도를 통해, 현지시간 6일 한 미국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 -

비행기 타본 적 없는 중국인 9억 명, 왜?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민항 산업이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인 9억3000만 명은 아직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여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항공 이용의 ‘그늘’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과 상하이 상하이 ... -

중국 희토류 카드 발동 임박…일본 경제 흔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중·중(中重)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일본의 대중(對中) 외교 행보를 고려해 2025년 4월 4일부터 관리 대상에 포함된 중·중 희토류 관련 물... -

미 언론 “미군 수송기·특수항공기 대거 유럽 이동”…특수작전 가능성 관측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군용 항공기들이 최근 단기간에 대거 유럽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돼, 미군의 유럽 내 특수작전 준비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군사 전문매체 더워존(The War Zone)은 5일(현지시간), 오픈소스 항공편 추적 데이터와 지상 관측 결과를 인용해 최근 다수의 미군 항공... -

“대만을 전쟁 위기로” 라이칭더 향한 탄핵 성토
[인터네셔널포커스]대만 내에서 라이칭더를 겨냥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라이칭더가 대만 사회의 주류 민의를 외면한 채 ‘반중·항중(抗中)’ 노선을 강화하며 양안(兩岸)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라이칭더가 대만 사... -

유엔 “미국의 대(對)베네수엘라 군사행동, 국제법 기본 원칙 훼손”
[인터내셔널포커스] 유엔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이 국제법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주권 침해와 무력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인 폴커 튀르크는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NEWS TOP 5
실시간뉴스
-
중국, 지난해 출생아 792만 명…1949년 이후 최저

-
“이게 세계가 원하는 미?” 177cm ‘甜妹’의 반전 도전

-
중국 반부패 ‘전면전’… 고위 간부 115명 포함 101만 명 입건

-
“고속열차 위로 크레인 붕괴”…태국 대형 철도 참사에 총리 격노

-
“세계 최대라더니!” 유럽이 확인한 하얼빈 빙설 현장

-
중국인 실종·연락 두절 속출… 중국, 캄보디아에 강경 메시지

-
AI로 씨앗을 설계하다… 중국, 육종 기간 절반으로 단축

-
中, AI로 입찰 비리 적발…… 공공권력 감시 새 국면

-
중국, ‘보이지 않는 부패’와 전쟁… 차명회사·회전문까지 정조준

-
‘중국인 탓’에서 ‘백인 오만’으로… 일본 관광 인식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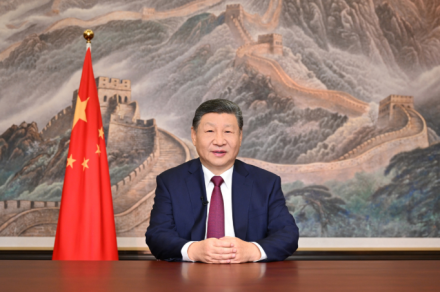
![[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data/news/202512/news_1766370493.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