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중국 U-23 축구, 사상 최고 성적 경신… 아시안컵 4강 쾌거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U-23 축구대표팀이 또 한 번 역사를 썼다. 중국은 17일 20시 30분(한국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AFC U23 아시안컵 2026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 U-23 축구대표팀과 연장까지 120분간 0-0으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하며 4강에 올랐다. U-23 아시안컵에... -

‘무실점 중국 vs 최강 일본’… 결승은 힘이 아니라 인내의 싸움
[인터내셔널포커스]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6 AFC U-23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중국 U23 축구대표팀과 일본 U23 축구대표팀이 맞붙는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일본이 앞서지만, 대회 흐름과 수비 안정성에서는 중국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 결승답게, 승부는 화려함보다 ‘실점 관리’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

중국 U23, 베트남 3-0 완파… 일본과 결승 맞대결
△중국 U23 대표팀 선수들이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골을 터뜨린 뒤 환호하고 있다. 중국은 이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대회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사진 :신화통신) [인터내셔널포커스... -

베트남·중국, U-23 아시안컵 준결승서 격돌… 한·일전은 ‘빅매치’
[인터내셔널포커스] 2026년 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 대진이 확정됐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8강전을 통해 한국과 일본, 베트남과 중국이 나란히 4강에 진출했다. 베트남은 8강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연장 접전 끝에 제압하며 준결승에 올랐다. 베트남은 중국과 결승 진출을 ... -

중국 U-23 수비축구에 쏟아진 비난… 일본 팬들 “결과가 답”
△중국 골키퍼 리하오(가운데), 선수 펑샤오(왼쪽), 그리고 베흐람 압두웨리가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U-23 대표팀이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4강에 오르자, 경기 이후 온라인 여론전이 벌... -

세트피스에서 갈린 승부… 한국 U23, 일본에 0-1 패
△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일본 U23 선수가 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AFC 공식 웹사이트)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 U23 대표팀이 일본의 문턱에서 멈췄다. 한국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 스타디움...
실시간뉴스
-
中배우 장위치 둘러싼 대리출산 의혹… 당사자 해명에도 논란 지속

-
김천 “모든 책임 지겠다”… 뺑소니 의혹 사과 후 희즈랑 광고 재개

-
무술배우 양소룡 영면… 선전서 장례식, 진혜민 지팡이 짚고 배웅·주성치 화환

-
니켈로디언 아역 출신 스타, 뉴욕 새벽 교통사고로 숨져

-
홍콩 액션 배우 양소룡 별세, 향년 77세

-
홍콩 5만 관객 앞에 선 저우선…“팬 덕분에 여기까지”

-
반세기 스크린 지킨 얼굴, 안성기 74세로 영면

-
황샤오밍, ‘신조협려’ 촬영 중 유역비 구조 일화 공개

-
외국인이 뽑은 ‘중국 10대 미녀’… 미적 기준 대반전, 1위는 담송운·2위 디리러바

-
연변 코미디 배우’ 채용, 55세 돌연 사망… 지역사회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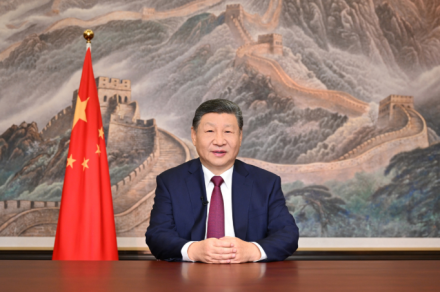
![[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data/news/202512/news_1766370493.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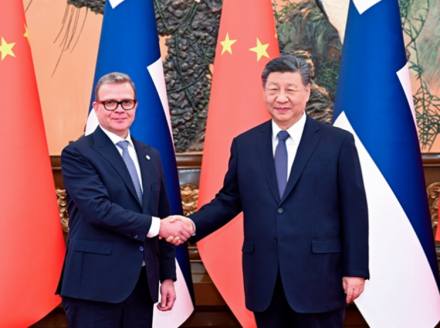

![[기획 연재 ④] 총과 권력이 만든 성의 무법지대](/data/news/202601/news_1769224829.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