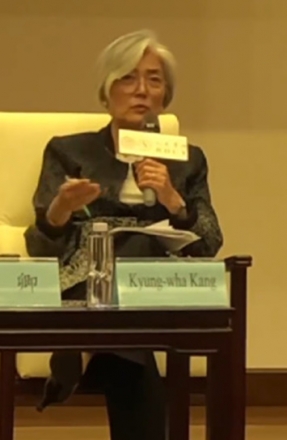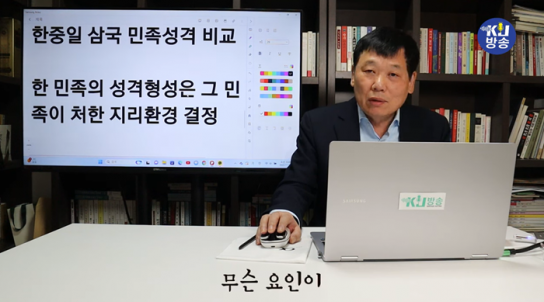[동포투데이]중국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한족, 조선족, 만주족 등 다민족이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적 풍경을 자랑한다. 이 지역의 8개 현·시 이름은 천년을 넘나드는 언어의 화석처럼 민족 이동, 문화 교류, 지리적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연길시(延吉市)
'연길'이라는 이름은 1902년 청나라 광서제 시기 처음 사용되었다. 청나라 광서 연간 초기 문서에 처음 등장한 '연집(烟集)'은 만주어 '연집와집(Yanji Weji)'(염소가 출몰하는 밀림)에서 유래했다. 1902년 행정구역 설정 시 '길상을 이어간다'는 뜻의 '연길'로 개명하며, 만주어 발음(Yanji)을 유지한 동시에 '회남자'의 '연년익길(延年益吉)' 뜻을 은유했다.
훈춘시(珲春市)
'훈춘'이란 이름은 동북아 최초의 해양문명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금대 여진어 '훈춘(Hunchun)'(따뜻한 물굽이)은 일본해 난류의 영향을 받는 부동항 특징을 생생히 묘사했다. 청 강희 53년(1714년) 훈춘협령 설치 당시 만주어로 '변방 요충지'를 의미하는 '훈춘"'으로 기록되었다. 현지에서 발굴된 '대육도구”(大六道沟)' 신석기 유적은 이곳이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의 교차점이었음을 입증하기도 한다.
도문시(图们市)
장백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이름은 여진어 '투멘 울라(Tumen ula)'(만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 1881년 오대징(吴大澂)이 '중러 훈춘동계조약'에서 한자 표기를 최초로 규정했다. 흥미롭게도 조선반도에서는 이 강을 '두만강'이라 부르며, 이는 선비어 '두막루'(급류)에서 유래했다. 이런 초국경 하류의 이중 명명 현상은 동북아 민족 이동사의 살아있는 증거이다.
돈화시(敦化市)
698년 말갈족이 이곳에 진국(후에 발해국)을 건설했으며, "오동성" 유적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청나라 광서 6년(1880년) 행정구역 설정 시 '중용'의 '대덕돈화(大德敦化)'에서 이름을 따 '발해 고도'의 문화 맥락을 계승하면서 "교화를 돈독히 한다"는 통치 이념을 담았다. 유교 경전과 변방 지리를 결합한 이 명명 방식은 중원 왕조의 국경 경영 지혜를 잘 반영한다.
용정시(龙井市)
'용정지명지'(龙井地名志)에 따르면 룡정시의 원래 이름은 '육도구'(六道沟)였으나, 그 곳 샘물은 맑고 달콤하며, 연중 마르지 않아 현지인들에게 '용의 우물'로 여기면서 길상과 풍요를 의미하였다. 1929년, 현지 정부는 공식적으로 '육도구'를 '용정'으로 개명하여 이 자연 경관의 문화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화룡시(和龙市)
화룡의 원래 이름은 '화룡곡'으로, 지형적 특징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화룡'(和龙)은 만주어로 '두 산 사이에 낀 골짜기'(两山夹一沟)를 의미하며, '곡'(峪)은 한어(汉语)로 '산골짜기'를 뜻한다. 따라서 '화룡곡'(和龙峪)은 만주족과 한족(汉族) 언어가 결합된 지명이다. '화룡'이라는 명칭은 1883년(청나라 광서 9년) '길림성 조선 통상 장정'(吉林省朝鲜通商章程)에서 처음 등장했다. 1884년(광서 10년)에는 화룡곡에 통상국을 설치하였고, 1902년(광서 28년) 청나라 정부가 이곳에 분방청(分防厅)을 설립했다. 이후 1910년(선통 2년)에 화룡곡 분방청이 화룡현(和龙县)으로 개편되었다.
왕청현(汪清县)
왕청현은 현청 인근에 위치한 왕청강(또는 왕청하)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강 이름을 사용한 전형적인 지명 방식에 속한다. '왕청'은 여진어(만주어) '왕친'에서 유래하였으며, 본래 의미는 '보루'를 뜻한다.
안도현(安图县)
안도현은 청나라 선통 원년(1909년)에 설립되었다. 청정부는 동북 변경을 공고히 하고 일본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두만강 상류 지역에 현을 설치하였다. 현 이름은 "두만강 경계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보호하며 백성을 안전하게 한다(安定图们江界,保国安民)"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연변의 지명은 단순한 지리적 표식이 아니다. 만주어·여진어는 청제국의 변천 개척사를, 한자는 중원 왕조의 통치 철학을, 조선어는 이민족의 적응과 전통 유지를, 신화와 지형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식을 기록했다.
이름 하나에 스민 수백 년의 언어·정치·문화적 충돌과 융합은 연변이 동북아의 "살아있는 박물관"임을 증명한다. 오늘날 이 지명들은 민족자치주의 현대적 정체성과도 맞닿아,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BEST 뉴스
-

서울 3년 살며 깨달은 한국의 민낯
영하 12도의 서울. 바람은 칼날처럼 뼛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홍대 입구에 서 있었다. 움직이는 이불 더미처럼 꽁꽁 싸매고, 온몸을 떨면서. 그때 정면에서 한국 여자 셋이 걸어왔다. 모직 코트는 활짝 열려 있고, 안에는 얇은 셔츠 하나. 아래는 짧은 치마. ‘광택 스타킹?’ 그런 거 없다. 그... -

마두로 체포 이후, 북한은 무엇을 보았나
글|안대주 국제 정치는 종종 사건 자체보다 ‘언제’ 벌어졌는지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한 직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맞물려 북한이 고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공개했다. 단순한 군사 훈련의 공개로 보기에는 시점... -

같은 혼잡, 다른 선택: 한국과 중국의 운전 문화
글|화영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는 순간, 뒤차가 속도를 높인다. 비켜주기는커녕, 들어올 틈을 원천 차단한다. 마치 양보가 곧 패배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도로에서는 ‘내가 우선’이... -

트럼프 2.0 이후 세계 정치 변화, 극우 확산의 구조적 배경
편집자주: 본 기사는 해외 정치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자의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세계 정치 환경 변화를 조망한 해설 기사입니다. 다양한 국가 사례와 학술적 관점을 종합해 재구성했으며, 기사에 담긴 해석은 참고용 분석입니다. 2025년 들어 전 세계 정치 지형에서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변화... -

“왜 이렇게 다른데도 모두 자신을 ‘중국인’이라 부를까”
글|화영 해외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종종 비슷한 의문이 제기된다. 남북으로 3000km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 영하 50도에서 영상 20도를 오가는 극단적인 기후, 서로 알아듣기 힘든 방언과 전혀 다른 음식 문화까지. 이처럼 차이가 극심한데도 중국인들은 자신을 ... -

중국산 혐오하면서 중국산으로 살아가는 나라
중국산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중국산 없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사회의 중국산 혐오는 이미 감정의 영역에 들어섰다. “중국산은 못 믿겠다”, “짝퉁 아니냐”는 말은 습관처럼 반복된다. 하지만 이 말은 대부분 소비 현장에서 힘을 잃는다. 불신은 말...
실시간뉴스
-
“홍콩 반환, 무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
역사 속 첫 여성 첩자 ‘여애(女艾)’… 고대의 권력 판도를 뒤집은 지략과 용기의 주인공

-
백두산 현장르포④ | 용정의 새벽, 백두산 아래에서 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

-
[기획연재③]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북간도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항일운동
![[기획연재③]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북간도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항일운동](/data/news/202510/news_1760826949.1.jpg)
-
백두산 현장르포③ | 지하삼림, 천지의 그늘 아래 살아 숨 쉬는 또 하나의 세계

-
백두산 현장르포② | 폭포 앞에서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
[기획연재②]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교육·신앙·항일의 불씨
![[기획연재②]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교육·신앙·항일의 불씨](/data/news/202509/news_1759108360.1.jpg)
-
[기획연재①]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문학, 민족, 그리고 기억의 장소
![[기획연재①] 윤동주 생가에서 보는 디아스포라 — 문학, 민족, 그리고 기억의 장소](/data/news/202509/news_1759037552.1.jpg)
-
백두산 현장르포① | 민족의 성산에서 천지를 마주하다

-
“해방군인가, 약탈군인가”…1945년 소련군의 만주 진출과 동북 산업 약탈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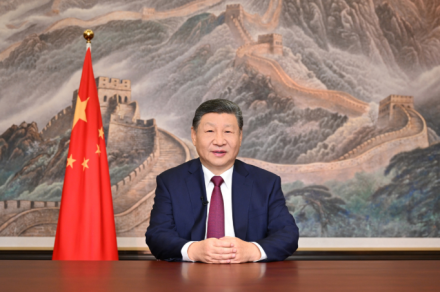
![[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data/news/202512/news_1766370493.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