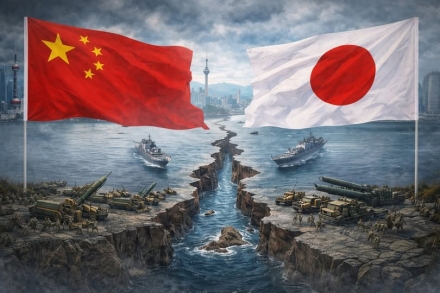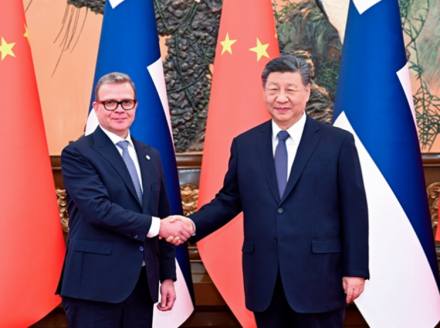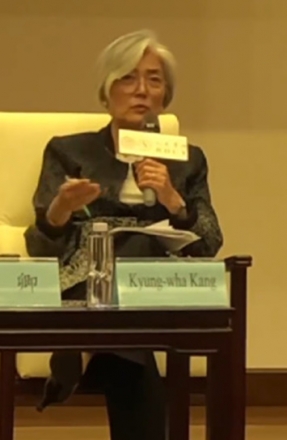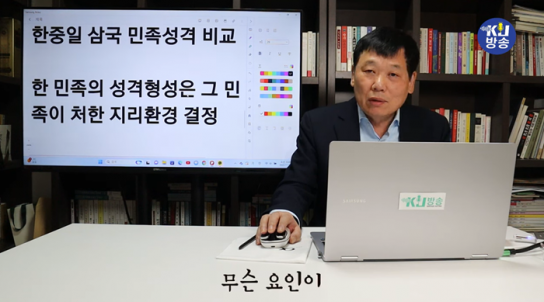“이게 발해야? 딱 봐도 당나라 강남 아닌가?”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珲春)에 위치한 관광지 ‘발해고진(渤海古镇)’을 찾은 일부 관광객들이 ‘속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발해를 테마로 했다는 고진(古镇)이 정작 당나라 강남 수향(水鄕)을 재현한 듯한 모습이라며 “간판만 발해고진이지, 실상은 딴판”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른바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식의 관광지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역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금의 이 풍경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발해라는 나라가 지닌 문화적 궤적과 닮아 있다.

당나라 수향이 스며든 발해의 풍경
사실 발해는 8세기부터 10세기 초까지 존재했던 국가로,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라는 정체성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의 교차로에 놓여 있었다. 그중에서도 발해는 당시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당나라와 밀접한 외교·문화 교류를 이어왔다. 수도 장안과 연결된 사절단이 수차례 오갔고, 제도·건축·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당나라 문화를 적극 수용했다.
건축에서는 두공(斗拱)과 비첨(飛簷) 등 전형적인 당대 양식이 궁궐과 사찰에 채택됐고, 도시 구조 또한 당시 중국 남방 지역의 강남 수향(江南水鄕) 도시들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강남 수향은 물길을 따라 이어진 마을과 흰 벽, 검은 기와, 목조 다리로 대표되는 전통 도시양식으로, 당나라 시기 절정의 도시미학을 보여준다.
발해가 남긴 유적지—오늘날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일대의 상경 용천부 유적 등—에서도 당나라 건축의 흔적은 명확하게 확인된다. 발해고진이 재현한 ‘당풍(唐風)의 수향 마을’은 의외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시각적 흥미를 위한 꾸밈이 아니라, 당나라 문화권에 속했던 발해의 도시 풍경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복원에 가깝다.

고진 골목에서 만나는 ‘당나라와 발해의 시간 여행’
발해고진에 들어서면 좁은 수로를 따라 흰 벽과 검은 기와의 누각, 정교한 나무 다리들이 이어진다. 언뜻 보기에는 강소성이나 절강성에 있는 전통 수향마을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금만 발걸음을 늦추면, 그 안에 담긴 발해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온다.
건물 외벽에는 발해 특유의 문양이 새겨진 부조가 설치돼 있고, 민속 전시관에는 발해 시대 복식과 가옥, 생활 도구들이 전시돼 있다. 또한, 당나라풍의 장식을 바탕으로 한 내부 공간에는 발해의 관제 체계, 불교 문화, 왕실 예술 등을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곳은 단순히 당나라 문화를 차용한 ‘복제 마을’이 아니라, 당과 발해가 역사적으로 교차하던 시기의 문화적 풍경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일종의 ‘시간의 복합지대’다.

조선족 떡부터 러시아 빵까지…이국의 맛과 빛으로 물드는 밤
해가 지고, 고진에 불이 하나둘 켜지면 거리는 또 다른 표정을 띠기 시작한다. 등불이 드리워진 골목은 고색창연한 정취로 물들고, 관광객들은 한복이나 당나라 복식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으며 낯선 시간 속을 거닌다.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맛’에 있다. 국경 도시 혼춘의 정체성을 반영하듯, 거리 한켠에선 조선족 아주머니가 즉석에서 찰떡을 빚고, 러시아빵이 구워져 나온다. 중국, 조선, 러시아의 음식이 어깨를 맞대고, 경계 없는 문화의 맛을 전한다. 단일한 ‘전통’이 아니라, 섞이고 중첩되는 다문화의 질감이 이 거리의 매력을 만든다.

간판이 아닌 이야기로 기억될 고진
“발해고진은 발해가 아니다”는 비판은 외형에만 기대어 내린 단순한 판단일 수 있다. 강남 수향을 닮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가짜’인 것은 아니다. 되살아난 건축 양식과 역사적 맥락, 그 속에 녹아 있는 발해의 기억들까지 두루 본다면, 이곳은 ‘재현’을 넘어 ‘재해석’된 역사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공간이 “발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발해의 이미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유적이 온전히 보존된 것도, 기록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발해고진은 오늘의 시선으로 과거를 되짚고, 단절된 기억의 틈을 메우려는 시도에 가깝다.
다음에 누군가 “발해고진은 간판만 발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되물어보자.
“그럼 당신이 아는 진짜 발해는 어떤 모습인가?”
BEST 뉴스
-

사료 왜곡 논란 부른 《태평년》의 ‘견양례’
글|안대주 최근 중국에서 개봉한 고장(古裝) 역사 대작 드라마 《태평년》이 고대 항복 의식인 ‘견양례(牵羊礼)’를 파격적으로 영상화하면서 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신체 노출과 굴욕을 암시하는 연출, 극단적인 참상 묘사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과도한 각색”... -

중국의 도발, 일본의 침묵… 결승전은 반전의 무대가 될까
“일본은 코너킥으로만 득점한다.” “선수들은 어리고, 쓸모없다.” “일본은 이미 끝났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문제는 축구가 언제나 말과 반대로 흘러왔다는 점이다. 이런 발언은 종종 상대를 무너뜨리기보다, 잠자고 있던 본능을 깨운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괜... -
![[기획 연재 ④] 총과 권력이 만든 성의 무법지대](/data/news/202601/news_1769224829.1.png)
[기획 연재 ④] 총과 권력이 만든 성의 무법지대
중국의 권력 질서는 단선적이지 않았다. 황제가 제도를 만들고, 사대부가 이를 해석하며, 향신이 지역 사회에 적용하는 동안에도, 제도의 균열은 늘 존재했다. 그 균열이 극대화될 때 등장하는 존재가 군벌이었다. 군벌은 법의 산물이 아니었고, 윤리의 결과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무력을 통해 권력을 획득했고, 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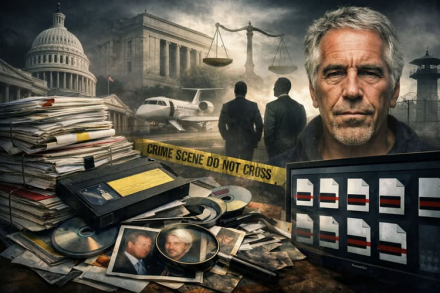
에프스타인 파일 공개… 300만 페이지로 가린 서구 체제의 불투명성
2026년 1월 30일, 미 법무부 차관 토드 블랜치는 에프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300만 페이지 이상의 문서와 2000여 개의 동영상, 18만 장에 달하는 사진을 대중에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2025년 11월 ‘에프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 발효 이후 이뤄진 최대 규모의 기록물 공개로 알려졌다. 그러... -

7쌍 중 5쌍은 한족과 결혼… 조선족 사회에 무슨 일이
글|김다윗 중국 내 조선족과 한족 간 통혼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조선족의 타민족 혼인 비율은 70% 안팎으로, 전국 소수민족 평균(약 25%)을 크게 웃돈다.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인구 구조·도시화·문화 적합성이 맞물린 ... -
![[기획 연재 ⑤] 법 바깥의 세계, 강호…범죄와 결합한 성](/data/news/202601/news_1769589935.1.png)
[기획 연재 ⑤] 법 바깥의 세계, 강호…범죄와 결합한 성
황제의 제도, 사대부의 언어, 향신의 관행, 군벌의 무력은 모두 ‘공식 권력’의 스펙트럼에 속했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는 언제나 이 질서의 바깥에 존재한 세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를 ‘강호(江湖)’라 불렀다. 강호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었다. 비밀 결사, 범죄 조직, 유랑 집단, 무장 폭력배, 밀수꾼과 ...







![[기획 연재 ⑦] 세 번의 성 인식 전환](/data/news/202601/news_1769843842.1.png)
![[기획 연재 ⑥] 가장 많은 규제, 가장 적은 선택―평민의 성 문화](/data/news/202601/news_1769729295.1.jpg)
![[기획 연재 ③] 향신 계층과 성 권력의 민낯](/data/news/202601/news_1769081302.1.png)
![[기획 연재 ②] 도덕을 말하던 자들의 은밀한 향락](/data/news/202601/news_1768997005.1.png)
![[기획 연재 ①] 황제의 방종, 백성의 금욕](/data/news/202601/news_176886212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