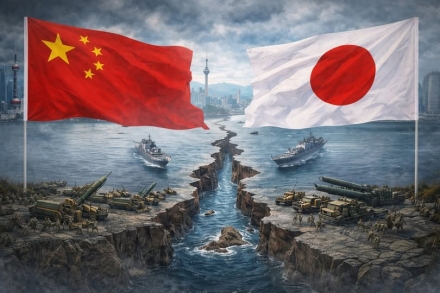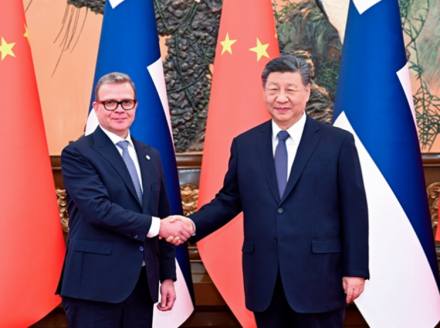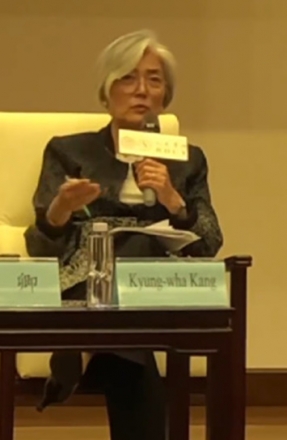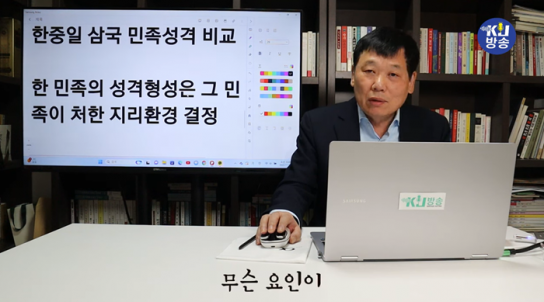●허 훈
오늘날 SNS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공간이지만, 때론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최근 한 네티즌이 중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보다 맛있다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은 사례가 그 예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식 선호도를 넘어, 민족 정체성과 경제적 현실이 충돌하는 복잡한 이슈를 드러냈다.
댓글란에는 극단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맛있다는 사람은 짱깨 빨갱이"라며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부터 "쓰레기 많이 처먹어라"는 혐오 표현까지, 감정이 격해진 모습이 역력했다. 이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적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수백 년 전통을 가진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산 김치를 칭찬하는 행위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존재했다. "중국산 10kg에 1만5천~7천원, 우주최강 가성비! 배추는 배추다 그냥"이라는 댓글은 경제적 약자에게 김치가 사치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물가 상승과 소득 격차 속에서 값싼 수입 김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이들도 많다. 특히 "직장인이나 점심을 사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수입 김치 없이 살 수 없다"는 의견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경고로 들린다. 김치 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저렴한 대안을 비난하기 전에,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상호 배제적인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중공산 김치 수입하는 놈, 사용하는 식당, 처먹는 놈들 모두 정신차려라"는 맹목적인 비판은 대화의 창을 닫아버린다. 상대방을 '무뇌충'으로 매도하며 시작된 논쟁에서는 어떤 건설적인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만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김치 논란은 문화적 자긍심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던진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김치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들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맛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공감과 이해라는 맛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BEST 뉴스
-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글|허훈 한국 사회에서 ‘중국’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혐오와 공포, 불신과 조롱이 뒤엉킨 감정의 대상이 됐다. 정치권과 유튜브, 포털 알고리즘은 이 감정을 증폭시키고, 우리는 어느새 중국을 이해하기보다 소비하고 있다. 중국을 모른 채 중국을 단정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조창완의... -

사료 왜곡 논란 부른 《태평년》의 ‘견양례’
글|안대주 최근 중국에서 개봉한 고장(古裝) 역사 대작 드라마 《태평년》이 고대 항복 의식인 ‘견양례(牵羊礼)’를 파격적으로 영상화하면서 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신체 노출과 굴욕을 암시하는 연출, 극단적인 참상 묘사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과도한 각색”... -
![[기획 연재 ①] 황제의 방종, 백성의 금욕](/data/news/202601/news_1768862127.1.jpg)
[기획 연재 ①] 황제의 방종, 백성의 금욕
중국 전통 사회의 성 문화는 하나의 얼굴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계층에 따라, 권력의 높이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작동했다. 누군가에게 성은 권력의 특권이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켜야 할 의무이자 족쇄였다. 이 극단적인 대비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황제가 있었다. 중국 역사에서 황제는 단순한... -

중국의 도발, 일본의 침묵… 결승전은 반전의 무대가 될까
“일본은 코너킥으로만 득점한다.” “선수들은 어리고, 쓸모없다.” “일본은 이미 끝났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문제는 축구가 언제나 말과 반대로 흘러왔다는 점이다. 이런 발언은 종종 상대를 무너뜨리기보다, 잠자고 있던 본능을 깨운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괜... -
![[기획 연재 ④] 총과 권력이 만든 성의 무법지대](/data/news/202601/news_1769224829.1.png)
[기획 연재 ④] 총과 권력이 만든 성의 무법지대
중국의 권력 질서는 단선적이지 않았다. 황제가 제도를 만들고, 사대부가 이를 해석하며, 향신이 지역 사회에 적용하는 동안에도, 제도의 균열은 늘 존재했다. 그 균열이 극대화될 때 등장하는 존재가 군벌이었다. 군벌은 법의 산물이 아니었고, 윤리의 결과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무력을 통해 권력을 획득했고, 그 ... -

서울에서 2년, 드라마가 말하지 않는 ‘한국의 계급’
글|안대주 서울에서 2년을 살고 나서야, 이 말을 꺼낼 수 있게 됐다. 현실의 한국 사회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익숙해진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회사의 해외 파견으로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머릿속은 한류 드라마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벌가와 상속자, 가난한 주인공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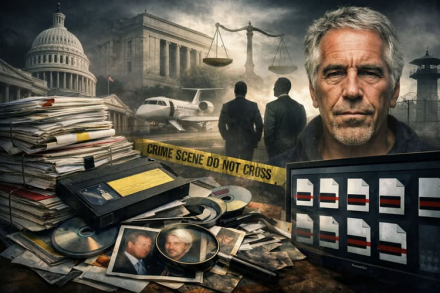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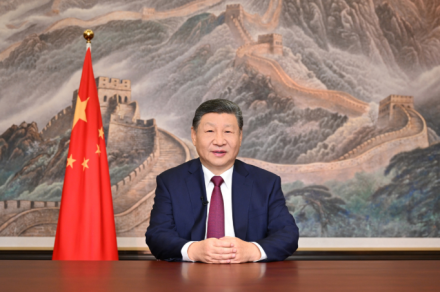
![[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data/news/202512/news_1766370493.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