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서울 명동의 한 카페. 28세 직장인 지수 씨는 휴대전화에 뜬 ‘중국 전기차, 한국 시장 점유율 15%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곧장 ‘화나요’ 버튼을 눌렀다. “또 시장을 뺏긴다는 건가요?”
이런 반응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낯설지 않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0% 이상이 중국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20대 젊은층의 대중(對中) 호감도는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 사회의 ‘반중 감정’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단순한 외교나 정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한 사회학 교수는 “한국인들이 두려워하는 건 중국이 아니라, 30년간 익숙해진 안전한 질서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다. 1991년 수교 당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중국의 86% 수준, 1인당 GDP는 중국의 20배에 달했다. 자동차·반도체·가전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보다 낫다”는 자부심이 자리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중국의 GDP는 일본을 제쳤고, 2020년에는 한국의 9배로 커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에서도 중국이 빠르게 추격해왔다.
삼성·LG가 주도하던 OLED 시장은 이제 중국 BOE, TCL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의 장비 국산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한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예전엔 우리가 중국에 기술을 가르치러 갔지만, 이제는 중국 기업이 한국으로 인재를 스카우트하러 온다”고 말했다.
무역 구조 역시 변했다. 2023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도 불안감을 키웠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우월감’을 흔들었다. “항상 앞서 있다고 믿어온 학생이 어느 날 전교 1등 자리를 빼앗긴 것과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보 문제에서도 비슷한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은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절대적인 안전판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미중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은 그 사이에 끼인 채 양쪽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됐다. 미국의 반도체 대중 제재에 동참했지만, 그 여파는 한국 기업에 더 크게 돌아왔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 활발히 교역하고 있다.
서울대 한 학생은 “우리는 미국이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이제 그 우산이 새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언론과 교육의 영향도 크다. 한국 언론은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산 식품 불안’ 같은 자극적 보도를 자주 내보내며, 중국의 긍정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룬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일부 교과서에서는 중국 문화를 ‘한반도에 일방적으로 전파된 외래문화’로 묘사해 균형 잡힌 시각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
25세 대학생 민영 씨는 “어릴 때부터 ‘중국은 못사는 나라다’라고 배웠는데, 성인이 되어보니 현실은 달랐다. 그 괴리감이 처음엔 분노로 바뀌었다”고 털어놓았다.
문화 영역에서도 경쟁심이 반중 정서로 이어진다. 중국과 역사·전통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설날’이나 ‘단오’ 같은 문화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민감하게 불붙는다. 한국 사회의 강한 자존심이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차별화 욕구로 작동하는 셈이다.
한 사회학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다. “한국인들이 불안한 이유는 중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익숙했던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호, 경제적 우위, 문화적 자부심 — 이 세 가지 습관이 깨지면서 감정적 반발이 생긴다.”
결국 ‘반중 정서’의 본질은 두려움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위협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수 씨는 이후 중국을 직접 방문해 인식이 달라졌다고 했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역동적이었어요. 경쟁도 있지만, 협력할 부분이 더 많다고 느꼈어요.”
중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다. 산업, 환경,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가’다.
이웃 간의 관계는 경쟁보다 이해를 통해 성숙한다. 이제 필요한 건 혐오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선이다.
실시간뉴스
-
중앙방송 개국 12주년 기념 시상식 성료… 공익가치 실천 영웅 조명

-
“대구 성서공단 베트남 노동자 추락사… 시민사회 ‘강제단속 중단하라’”

-
“죽음이 다가올 때,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

-
다문화 어머니 농구단, 용산구청장배서 또 연패… “내년엔 꼭 이긴다”

-
“중국이 아니라 변화가 두렵다” — 한국 내 반중 감정의 진짜 이유

-
외국인 향한 혐오 표현, 경찰 “사회적 해악…단호히 대응”

-
“경비 공백이 참사 불렀다”… 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발표

-
“아기만은 살려야”…오산 화재서 두 달 된 아기 이웃에 건넨 중국인 여성, 추락사

-
개그맨 이진호 연인 자택서 숨져…“범죄 혐의점은 없어”

-
월성원전 또 중수 유출…올해 두 번째 “안전 불안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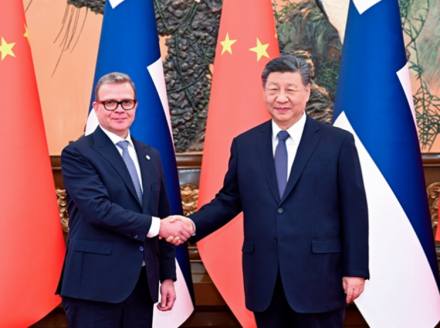

![[기획 연재 ④] 총과 권력이 만든 성의 무법지대](/data/news/202601/news_1769224829.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