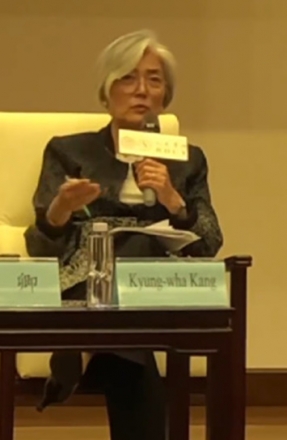●김 혁 (재중동포 소설가, 역사칼럼니스트)
에어콘이 고장났다. 하필이면 이 삼복더위에.
판매상과 연계해 고치려니 이핑계 저핑계 시종 찾아주질 않는다. 그렇다고 스스로 뜯어 가져가기도 번거롭고 해서 더위에 대처할 궁여지책으로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구식 선풍기를 꺼내 먼지를 닦고 다시 돌렸다. 개운치 못하다.
나의 애견 두 마리도 더위에 꼬리를 사린채 혀를 잔뜩 빼물고 있다. 빈 콜라병에 물을 채워 냉장고에 얼구었다 꺼내주니 두 녀석 다 찬 병에 배를 딱 붙이고 엎드려 있다. 그래도 여전히 더운지 혀를 빼물고 주인장을 빤히 쳐다보며 할딱거린다. 더웁기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다.
불볕더위란 말이 명실상부하게 다가온다. 이 더위를 어떻게 지내얄지?
2
요즘 세월에는 에어콘이다, 선풍기다, 냉장고다 해서 그나마 더위를 쉽게 보내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 더위를 물리쳤을가?
살펴보니 옛사람들은 더위나기에 무척 고심했고 그 노력은 나름 이채롭기까지 했다.
“오월춘추 (吴越春秋)”의 기재를 보면, 춘추시기 여름이 되면 궁정에서는 얼음 찬장 (冰厨) 을 만들었다고 한다. 월나라 왕 구천(勾践)은 가장 더운 삼복기간이면 그 얼음 찬장”에서 지냈다고 한다.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한 수 더 떠서 궁정에 기계의 힘을 빌어 좌우로 움직이는 부채를 설치했다고 한다. "극록담(克录谈)이란 책에도 용피선(龍皮扇)이라는 부채가 등장을 하는데 신라의 스님들이 가져 온 특수 어피(漁皮)로 만든 이 부채는 당나라의 대부호가 소유했던 것으로 부채는 흔들지 않아도 저절로 부채에서 찬 바람이 나왔다고 적고 있다. 요즘의 선풍기의 비조(鼻祖)라고 할가.
그리고 또 찬물을 관작들의 거처의 지붕으로부터 내리부어 인공비줄기를 만들었는데 그 장면이 실로 가관이었다. 이러한 피서 장치가 되어있는 집을 “수정(水亭)”이라고 불렀다.
당나라의 경국지색 양귀비는 더운 여름엔 설산의 눈 속에서 자란 누에 꼬치에서 뽑아낸 명주 실로 짠 빙잠옷(氷蠶衣)을 입고 더위를 이겨 냈다고 한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더위가 석자 앞에서 물러 났다나?
거기다 양귀비의 오라비 양국충의 피서법도 가히 사치와 호사의 극치 였다, 빙병(氷屛)이라 하여 얼음으로 만든 병풍을 만들어 쳤는데 그 얼음 병풍에다 산수화나 “십장생”그림까지 새겼다고 한다.
얼음 병풍을 치고 연회를 벌이다가 지나치게 추워지면 기생들을 홀랑 벗겨 그 체온으로 냉기를 중화 시켰다 하는데 이를 가리켜서는 육병(肉屛)이라 했다. 그야말로 피서 무도(避暑无道)가 아닐 수 없다,
청나라 때에는 임금과 황후들이 궁정을 나와 피서지로 가는 방법이 류행되었는데 그래서 오늘날중국의 유람성지인 하북 승덕(承德)피서산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문헌 "두양잡편"(杜阳杂篇)에서는 특이한 게 눈에 띄는데 신기한 화분 한점을 키워 이를 창문에다 올려 놓으면 더운 바람이 지나면서 저절로 시원한 바람으로 바뀐다고 했다. 봉황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봉수목(鳳首木)"이란 이름이 붙은 이 화분은 이를 방안에 두면 서 너 칸 냉방은 거뜬 했다고 한다,
이러한 피서 백태(百態)는 더위에 시르죽은 마음들을 무마하기 위한 전설이라 여겨진다. 우리민족의 선조들도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다. 먼저 열(热)로서 더위를 다스리는 “이열치열 (以热治热)”의 방법이 있다. 이맘 때 딱 좋은 음식으로 삼계탕과 개장국을 든다.
당연히 “이냉치열(以冷治热)”의 방법도 있다. 참외, 수박 같은 과일을 흐르는 물에 담가두었다가 먹고 싶을때 꺼내 먹곤했는데 그 시원 달콤한 맛은 무더위를 싹 가시게 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 입었던 것은 삼베옷, 모시옷이다. 더위가 계속 이어질 때는 생모시로 된 고의, 적삼 또는 치마를 해 입었다. 이런 옷들은 습기를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었다.
통풍과 해볕 가림을 하기 위해 발을 치고 돗자리를 깐다. 발이 처진 방 안에 돗자리를 깔고 누우면 더위도 한 발 물러서게 마련이다. 낮잠이라도 청할 양이면 없어서는 안될 것이 목침이다.
다음 탁족(濯足)이라는 운치있는 방식이 있다. 말 그대로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흐르는 물에 더위를 씻어내는 일이다. 녹음이 만드는 짙은 그늘과 귓가를 스치는 요란한 물소리가 한 여름 더위를 단번에 사라지게 한다.
더위 피해 물 가에서 다투어 발 담그니(避暑水边爭濯足)… “도하세시기속시(都下岁时紀俗诗)” 중의 한 구절이다.
탁족은 몸의 열을 내모는 기 순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즉 발은 모든 신경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발을 식힘으로써 온몸에 찬 기운을 불어넣는 이치이다.
호젓한 계곡을 찾아 흐르는 물에 신심을 담그고 속세의 번뇌를 씻어내리며 그윽한 시조 한 수 읊조리는 일, 그야말로 운치 있는 더위 나기가 아닌가!
3
옛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유용한 피서법으로는 책읽기가 있다.
“열하일기”의 저자 연암 박지원은 사촌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옷을 벗거나 부채를 휘둘러도 불꽃 같은 열을 견뎌내지 못하면 더욱 덥기만 할뿐, 책읽기에 착심(着心)해 더위를 이겨나갈 것”을 충고하기도 했다.
사실 책읽기 정말 힘든 계절이다. 눅눅한 습기와 끈적끈적한 무더위, 어지간히 책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손에 책을 잡고 있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를 책을 통해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 여름과 책의 관계는 역설 그 자체이다.
책읽기를 뜻하는 한자말에는 독서말고도 “간서(看书)”, 그리고 “피서(披书)”라는 말이 있다. 그러고보니 “피서(披書)”와 “피서(避暑)”는 음이 꼭 닮았다.
독서야말로 습하고 더운 일상에서 벗어나는 가장 쉽고 매우 저렴한 길이 아닐가 한다.
“청우재(听雨斋)”에서